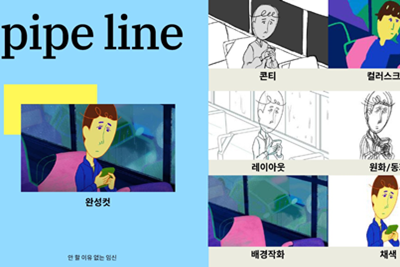REVIEW
영화를 읽다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던지는 마음의 호소
<캐치볼>
최민아 / 2020-09-03
| 〈캐치볼〉 ▶ GO 퍼플레이 주민경|2020|다큐멘터리|한국|11분 |
기울어진 운동장의 끝은 어디일까.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게 되었을 때,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세계는 이미 공평하지 않은 게임이 무수히 벌어지고 있었다. 내가 택하였든 내게 주어졌든,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게임의 법칙이 곳곳에 흩뿌려져 있다. 우리는 그저 오롯이 받아내야 할 뿐이고, 그 안에서 버티는 자만이 존재로서 호명된다. 영화 〈캐치볼〉(주민경, 2020)은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학부생으로서,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영화를 만드는 ‘나’, 혹은 ‘A씨’가 꿈과 현실을 오가며 자신(들)의 존재를 말하는 영화이다.
 〈캐치볼〉 스틸컷
〈캐치볼〉 스틸컷
‘나’는 어릴 적부터 영화의 꿈을 가져왔지만 그간 마주한 세간의 말들은 물론, 영화를 만들기 위해 진학한 대학에서조차 여성은 영화 촬영장에서 일하기 힘들다는 말을 끊임없이 들어야 했다. 그러한 반응에 주춤하던 시절도 있지만, 그렇게 받아들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스스로 싸워 이겨내기로 했고, 누군가의 호명에 의한 존재가 되기보다 스스로를 증명하는 존재가 되기로 하였다.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언어인 ‘영화’를 통해. 감독은 그렇게 카메라를 들고 자전적 고민을 담아내었고, 여성 동지들과 함께 나와 우리에 대한 영화 〈캐치볼〉을 완성하였다.
영화는 성별과 지역으로 인한 불균형의 세계를 픽션과 다큐멘터리 이중구조로 그려내며 ‘캐치볼’이라는 비유를 차용한다. 영화를 찍고 싶어 하는 여성 학부생에 대한 픽션, 그리고 이 영화를 찍는 이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그 안에서 반복되는 ‘캐치볼’. 영화를 이루는 이 요소들은 현실을 그대로 비추기도, 비현실의 세계를 현실의 세계로 그려내기도 하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나’의 이야기이기도, 혹은 나‘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게끔 그 경계를 넘나든다.
 〈캐치볼〉 스틸컷
〈캐치볼〉 스틸컷
‘영화판’은 〈캐치볼〉에서 지적하는 불균형이 여느 업계 못지않은 곳이다. 이른바 주요하다는 보직은 남성을 중심으로, 업계를 움직이는 자원은 서울을 중심으로 흐른다. 〈캐치볼〉은 이에 대해 증언하고 질문하며, 공공연하지만 언어화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직접 마주할 것을 제안한다.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남성 학부생들에게 인터뷰를 청했고, 이들로부터 여성 학부생들에 대해 존경을 표하는 답이 돌아왔다. 자신이 여성이었다면 촬영을 꿈꾸지 못했을 것이라든지, 여성들이 지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존경스럽다든지, 언뜻 다른 모양새를 하고 있는 듯하지만 이는 세간의 말들과 다르지 않다. 여성을 동등한 동료로 보지 않고 그저 성별에 의한 판단으로 동정과 존경을 늘어놓을 뿐이었다. 어째서 누군가의 세계는 당연하고 누군가의 세계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정의되는 것일까?
 〈캐치볼〉 스틸컷
〈캐치볼〉 스틸컷
이들이 살고 있는 부산은 자타공인 ‘영화의 도시’로 불리며 영화산업의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된 도시이다. 영화인과 관객 모두가 동경하고 전 세계에서 이곳으로 영화를 향해 모여들지만, 정작 부산에서 영화를 업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속 빈 강정’처럼 느껴질 뿐이다. 풍요 속 빈곤은 우리를 더 외롭게 하고, 없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닌 채로 방황은 계속된다. 조금 눈을 돌려보면 수도권 중심의 현실은 다시 부산이라는 조건이 한계가 되어 부딪히고, 어디를 향해도 설 자리가 없는 듯한 기분이 멀리 느껴지지 않는다. 우리는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영화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걸까?
현실은 쉬이 변하지 않고 플랫하게 기울어진 채로 계속될 뿐이지만, 영화는 다양한 목소리와 움직임으로 이들의 상황과 심경을 전한다. 내레이션과 대사를 통해 나와 우리를 대변하거나, 건조한 전자음을 통해 통쾌하게 속내를 비추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현실을 재현하며 바로 지금의 상황을 말하고, 환상인지 모를 기이한 순간들을 그려내며 혼란스러운 심경을 전한다. 그 말과 마음들은 자조처럼 들리다가도 어느샌가 선언의 모습을 띤다. 응축된 ‘마음의 호소’가 절실하게 들려오는 순간이다.
 〈캐치볼〉 스틸컷
〈캐치볼〉 스틸컷
‘캐치볼’은 나와 상대가 공을 주고받는 게임이다. 그러나 〈캐치볼〉의 세계에는 주고받는 랠리(Rally)가 존재하지 않는다. 막다른 벽을 향해 계속해서 공을 던지지만 곧바로 튕겨져 나올 뿐이다. 하지만 이들은 공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던지기를 시도한다. 그러기를 반복하다 내던져버려도 어느새 내 안에 다시 들어와 있는 공처럼, 오직 해내는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인생이 있다. 매일이 도전이지만 ‘나’로 존재하기 위해 혼자 하는 캐치볼을 멈추지 않는 이들, 애초에 혼자 하는 캐치볼은 모순적이지만 하나하나의 ‘혼자 하는 캐치볼’들이 모여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해낼 것이다.
 〈캐치볼〉 스틸컷
〈캐치볼〉 스틸컷
영화에서 현실로 뛰쳐나오는 ‘A씨’가 던진 공이 커다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오르고, ‘나’는 이 공을 받아 다시 힘껏 던진다. 나와 내가 주고받는 캐치볼, 혹은 우리가 서로를 향해 던지는 캐치볼. 감독의 말처럼 이 영화는 다른 여성 영화인에게 공을 던지는 마음으로, 어딘가에 있을 자신(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담아 기울어진 운동장 한가운데 〈캐치볼〉이라는 이름으로 제 발로 서게 되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영화를 만드는 여성들을 프레임 한가득 담아내는 감독의 어떤 간절한 마음처럼, 이들(로 대변되는 모든 여성)이 자기 자신으로 온전하게 꿈꾸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또 다른 ‘캐치볼’을 나 또한 던져본다. 세상은 이 마음의 호소에 응답해야만 한다.
PURZOOMER

인디다큐페스티발 사무국 활동가
관련 영화 보기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