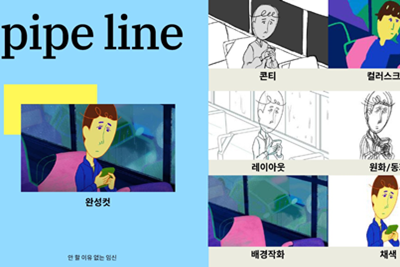REVIEW
영화를 읽다
[‘우리는 매일매일’ 편지 이벤트] From 영 To 강유가람
세 번째 편지
퍼플레이 / 2021-08-12
| 이 편지는 <우리는 매일매일>의 개봉을 응원하며 퍼플레이에서 진행한 이벤트 ‘From 영영페미 To 영페미’를 통해 도착하였습니다. 관객들이 전해준 소중한 마음들 중 세 개의 이야기를 뽑아 조심스럽게 공개합니다. |
#3-1 From 영 To 강유가람
어떤 다큐멘터리들을 보고 나면, 기록으로 말을 건넨다는 게 이렇게 따뜻할 수 있는 일이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잘 만들어진 이야기를 만들어 건네는 사람들을 볼 때면 나도 나의 이야기를 건네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곤 합니다.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던 적도 분명히 있었는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하는 일인지 잘 모르겠어서 내심 포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객이 무사히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요리하는 일. 가능하다면 그 속 인물들 역시 온 맘 다해 사랑하고 싶다는 욕심. 기술적인 부분을 잘 다루어 충분히 가공된 이야기를 만들어내면, 관객에게까지 무사히 따스함이 스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욕심과 기대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해서 그럴까요? 종종 길을 잃습니다. 누군가는 인물과 이야기가 쓰는 이를 벗어나 달려 나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서사가 생명을 가진다고 하던데, 저는 항상 이야기가 저를 벗어나면 주저 앉아버려요.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잘 만들어진 이야기들을 보면 항상 벅차고,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이태원>과 <우리는 매일매일>을 보고도 그랬어요. 인물을 사랑하게 만들고, 거기에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까지 분명히 녹여내는 작업은 어떤 순간들이 쌓여야 가능한 걸까? 종종 궁금해 합니다. 게다가 다큐멘터리의 인물들은 실존하는 사람들인데, 삶을 듣고 지켜보고 묻고 답변을 요청하는 일은 정말 마음을 많이 써야 하는 일인데, 그걸 기록하고 편집하여 이야기를 건네는 건 어떤 작업일까? 애초에 나의 것이 아닌 이야기를 다룬다는 게 많이 벅차지는 않을까? 궁금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편지는, <우리는 매일매일>을 잘 보았다는 감사 인사인 동시에, 약간의 질투 어린 글입니다. 혹은 감독님이 어떤 마음으로 작업을 하고 계신지 엿보고 싶다는 요청일 수도 있겠네요. 너무 무례한 질문이 아니기를 바라며, 이 편지가 무사히 도착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2021년, 7월의 어느 날
따스함이 전해지길 바라며 영. <우리는 매일매일>의 강유가람 감독
<우리는 매일매일>의 강유가람 감독
#3-2 From 강유가람 To 영
안녕하세요. 강유가람입니다. 다정하고 솔직한 편지, 감사합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늘 고민하는 주제여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실존하는 인물의 삶을 듣고 지켜보고 묻고, 답변을 요청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의 매 순간마다 이 사람은 왜 나의 제안을 수락했을까 하는 고민을 해야 하고, 그로 인한 심적 부담이 늘 따라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반드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출연자들의 마음에도 울림을 줄 것이라는 믿음을 붙들고 가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출연자들은 단순히 출연자가 아니라 다큐멘터리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참여자라는 믿음도요. 그 믿음의 무게는 상당한데, 그것은 타인의 목소리를 빌어서 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짊어져야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만으로는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 같지는 않기도 해요. 출연자를 정말 궁금해 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의 삶을 누군가에게는 전해주고 싶은 욕망이 생겨버리거든요. 어쩌면 그게 제일 큰 동력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 마음만 전달하는 일방통행이 되면 안 될 테니 잘 듣는 자세를 통해서 신뢰감을 쌓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번 제 마음만 드러낸 채 출연자를 만나러 갔다가는 아마 그 사람도 저에게 질릴 거예요.
언젠가 <이태원> 편집이 너무 어려워서 괴로워하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왕자가 된 소녀들> 김혜정 감독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좋아하는 장면만 한 번 이어서 붙여봐.” 정말 그렇게 했더니 인물들이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인물의 모든 부분을 사랑할 수는 없다고 해도 내가 좋아하는 어떤 부분을 보여주고 싶은지 정리하는 게 필요했던 거였어요.
<우리는 매일매일>을 만들 때의 마음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내가 영향 받았던 그 시절과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면 아마 관객들도 출연자들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매일매일>로 공동체 상영을 할 때 몇몇 분이 “나도 내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때 <우리는 매일매일>은 영화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의 서사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국면으로 달아나는 것은 어쩌면 이야기의 숙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나를 벗어나는 이야기는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몫으로 남기고 나는 계속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집중하는 게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나’의 욕망은 결국 ‘나의 이야기’가 될 테니까요.
어쩌면 원론적으로 들리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조금 낯간지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사랑이라는 말을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것일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마치 러브레터처럼요. 편지를 보내주신 분께 저의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편지를 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또 어디선가 이렇게 이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강유가람 드림.
PURZOOMER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여성 그리고 영화에 대한 다채로운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관련 영화 보기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