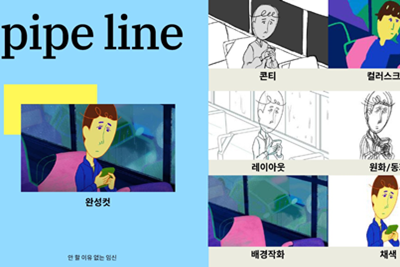REVIEW
영화를 읽다
걷고 싶어 걷고, 행복하고 싶어 행복을 찾을 뿐
<옆길>
최민아 / 2020-06-18
| <옆길> ▶ GO 퍼플레이 김주혜, 이수빈|2017|다큐멘터리|한국|30분 |
 <옆길> 스틸컷
<옆길> 스틸컷
일상의 언어지만 입에 잘 오르지 않는 말들이 있다. 그중 상당수의 일부는 자신의 원초적 감정을 이르는 말일 것이다. 어쩐지 낯간지러워서,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해서, 감추어지는 숱한 말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행복’이란 말 역시 그러하다. 행복의 정체는 무엇인지, 나는 행복한지, 우리는 행복을 원하는지, 입 밖으로 내거나 의식하지 않(는 듯하)지만 이미 저마다의 언어와 그 의미를 탐구하는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다.
영화 <옆길>(김주혜·이수빈, 2017)은 그 원초적 감정에 충실한 이들이 써 내려가는 표해록이다. 스물여섯 청춘의 여름날, 서울에서 내가 사라질 것 같은 어떤 불안감으로부터 비롯된 이 기록은 직장도, 집도, 돈도 없이 행복하지 못한 ‘나’(주혜)와 대학 시절 친구 수빈이 손을 맞잡으며 시작한다. 이들의 골-인(Goal-in) 지점은 바로 ‘행복’, 자신에게 행복을 알려줄 행복한 사람을 찾아서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한다.
 <옆길> 스틸컷
<옆길> 스틸컷
수빈은 축구 대행사 매니저와 스키강사로 일했고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이 안 돼 백수가 되었다. 행복은 개뿔, 돈이 최고라고 믿는다. 주혜는 K리그 소속 축구 구단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담당했지만 정작 자신이 행복하지 않아 퇴사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비슷하지만 다른 스물여섯 동갑내기 두 사람은 7일간의 서울여행을 계획한다. 이들 여행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다.
하나, 오직 걸어서 서울여행을 한다.
둘, (프랑스 중산층처럼 스포츠와 악기를 즐기며) 축구와 리코더 연주를 한다.
셋, 서울에 자취방이 있지만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이들 여정의 중심에는 ‘서울’이 존재한다. 7일간 여행의 목표는 서울 일주, 여행의 시작은 서울 한복판인 시청 잔디광장을 기점으로 한다. ‘서울에서 내가 사라질 것 같은’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내가 살고 있는 곳 서울’에서 행복을 찾아 나가고자 하는 어떤 열망 혹은 안간힘이 느껴진다. 언뜻 ‘서울’로 치환될 수 있지만 이들의 진짜 목적어는 ‘내가 살고 있는 곳’, 바로 그곳에서의 행복을 찾는 일일 것이다. 다른 조건이나 환경을 찾아 떠나야 얻어지는 행복이 아닌, 내가 딛고 있는 이곳에서 스스로를 지키며 행복을 찾아 나가고 싶은 일상 여행자의 기록을 펼쳐나간다.
 <옆길> 스틸컷
<옆길> 스틸컷
배낭을 메고 길을 나선 두 사람, 여행은 시작부터 이들의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 시청 잔디광장에서의 여유로운 오프닝을 꿈꿨지만 집회로 분주한 광장을 마주하고 당황한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고 두 사람은 길 위의 사람들과 만난다. 광장에 나선 노조원들이 무슨 사정인지 궁금해 말을 걸고 걸음을 나란히 하며 삶과 그 가치에 대해 탐문한다. 이러한 물음은 강남을 채우는 화려한 아파트를 향해서도, 코인 몇 개로 앉은 자리에서 수고를 덜어주는 빨래방에서도, 지하 화장실에 처박혀 울며 한 달 전까지 다니던 직장과 마주치면서도 계속된다. 행복은 누구의 것인지, 나와 너는 무엇으로 행복한지, 끊임없이 말을 건네며 걸어 나간다. 이는 서로 간의 질의응답이기도 하고, 어떤 이의 고백이기도 할 것이다. 행복은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는 이들의 말처럼, 일상에서 가져온 솔직한 감정을 캐치볼처럼 주고받는 두 사람을 따라가며 우리는 한 번쯤 자신에게 그 질문을 던져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행복의 정체는 무엇인지, 나는 행복한지, 우리는 행복을 원하는지.
 <옆길> 스틸컷
<옆길> 스틸컷
때때로 두 사람의 서울 일주 규칙은 지켜지지 않기도 한다. 며칠 전 숙소에 두고 온 물건을 찾으러 가야 하지만 너무 덥고 힘들 뿐, 이내 버스에 오르며 자신의 상태와 감정에 가장 충실한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딱히 자책하거나 질책하지 않는다. 다시 길을 나설 때 규칙은 재정립될 것인지 또한 그때 가서 결정하기로 한다. 이 순간은 두 사람이 결의한 여행길 못지않은 뜻밖의 해방감을 선사한다. 인생이란 그런 것이 아닐까, 이쯤에서 문득 생각해본다. 자신과의 약속이란 힘들면 지키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고 자기합리화란 나를 살게 하는 실제적 방편이지 않을까. 스스로에게 얽매이거나 자신을 가두지 않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나를 미지의 행복과 만나게 하는 스스로의 구원일지도 모른다.
길 위의 수많은 우연들 속에서 틈틈이 공을 차고 리코더를 불며 부단히 행복을 찾는 두 사람. 날지 못한 운명이 가여워 여행길의 동반자로 선발된 글라이더는 결국 여행 중 날개가 부러지고, 왜 샀는지 모르겠는 정체불명의 판넬은 쓰임이 없지만 여정 내내 함께한다. 그러나 부서진 글라이더는 그것 그대로, 쓰임 없는 판넬 또한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 자체로의 저마다 소용을 다 하며 어느 것 하나 천덕꾸러기 되는 일 없이 어깨를 나란히 한다. 공과 리코더가 이들 행복의 가치를 비추듯, 말 없는 두 동반자는 이들 존재를 비추는 또 다른 배경이 되어준다.
 <옆길> 스틸컷
<옆길> 스틸컷
행운의 네 잎 클로버도 행복의 정체도 찾지 못하지만, 지난날의 나보다 지금 이 길바닥 위의 내가 더 행복함을 이들은 알고 있다. 이것은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함이다. 그야말로 ‘행복하고 싶으니까’ 행복을 찾는 두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라는 물음에 “행복을 찾는 거야”라고 답하는 그 순수가 이 여정에 동참하는 우리를 잠시나마 행복에 이르게 할 것이다.
PURZOOMER

인디다큐페스티발 사무국 활동가
관련 영화 보기
REVIEW